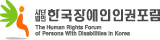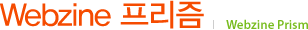HOME > Webzine 프리즘 > Webzine 프리즘
본문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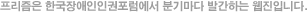



시드니에서 잊혀진 과거를 만났다 이범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옛날 사람들은 호를 지어서 때로 자신의 이름을 대신하곤 했다. 이름이 주는 딱딱함이랄까 아니면 이름 안에 담긴 정보의 어떤 보수성이랄까 하는 것에 비해 호는 형식도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자유스럽고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기도 하니 자의식이 드러나는 느낌도 있다. 그래서 현대의 사람들도 가끔 호를 짓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호를 갖게 되었다. 바로 e-mail 때문이다. 이메일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이름짓기-환경이다. 이메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만들어진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어보는 새로운 경험을 안겨 주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본 이름을 그냥 영어로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기도 한다.
벌써 10여년이 지난 언젠가 신문물에 그닥 민감하지 못했던 나도 뒤늦게 이메일 이름을 지어야 했고 그 때 지은 이메일 이름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이름이 ‘downunde’이다. 원래 짓고 싶었던 이름은 'downunder'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메일 이름을 8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서 마지막 'r'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직도 사용하는 이메일 이름을 ‘downunde'라고 지었던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오랜전에 좋아했던 호주출신의 뉴웨이브 밴드 'Men at Work'의 히트곡 ‘Downunder' 때문이었다. 'Men at Work'는 198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호주 출신의 록밴드였는데 단순한 악기 편성과 코드편성, 그리고 조금은 불협화음 같은 음들을 교묘하게 버무려서 쉬운면서도 약간은 펑키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던 락 밴드였다. 남미 토속 음악의 멜로디를 차용한 듯한 플룻 연주와 레게 리듬이 빚어내는 이 곡의 독특한 스타일은 이 곡이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이들은 첫앨범 ’Business as Usual'(1982)에서 두 개의 빌보드 1위곡들 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Downunder'였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의 지리적 특성을 뜻하는 별칭인 "Down Under"라는 노래가 호주인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사회의 죄수들, 한마디로 유럽에서 방출된 쓰레기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들이 품을 수밖에 없는 뿌리 깊은 열등의식과 애환을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에 잘 담아낸 곡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기위로인 셈인데 가사를 음미하면 이해가 쉽다. 나는 ‘아래’라는 뜻이 중복되는 이 노래의 제목에서 당시의 내 처지나 지향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폐막 행사 때도 ‘Men At Work’는 메인 무대에 올라 'Down Under'를 불렀다고 한다.
Travelling in a fried-out Kombi
On a hippie trail, head full of zombie
I met a strange lady, she made me nervous
She took me in and gave me breakfast
And she said,
푹푹 찌는 화물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히피처럼 다녔지. 머리 속은 좀비나 다름없었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날 긴장케 했지
그녀는 날 초대하고 아침식사를 주곤 말했지
"Do you come from a land down under
Where women glow and men plunder
Can't you hear, can't you hear the thunder
You'd better run, you'd better take cover."
당신은 저 아래에 있는 땅에서 왔나요?
여자들은 빛나게 예쁘고 남자들은 물건을 팔아먹는 곳
천둥소리가,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도망쳐요, 다른 곳으로 가는게 좋아요
Buying bread from a man in Brussels
He was six foot four and full of muscle
I said, "Do you speak-a my language?"
He just smiled and gave me a Vegemite sandwich
And he said,
브뤼셀(벨기에)에서 온 남자에게서 빵을 샀어
키는 6피트 4인치(190cm)에 근육질이었어
난 말했지 "우리 나라 말을 할 줄 아시나요?"
그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내게 야채 샌드위치를 주고
말하더군
"I come from a land down under
Where beer does flow and men chunder
Can't you hear, can't you hear the thunder
You'd better run, you'd better take cover."
난 저 아래에 있는 땅에서 왔죠
맥주가 강처럼 흐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노는 곳(실제로는 토한다는 뜻임)
천둥소리가,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도망쳐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Lying in a den in Bombay
Slack jaw, not much to say
I said to the man, "Are you trying to tempt me
Because I come from the land of plenty?"
And he said,
봄베이(인도)의 굴에 누워서
턱도 축 늘어졌고, 할 말도 없었어
난 옆의 남자에게 말했지 "내가 풍족한 땅에서
왔다는 걸 알고 현혹하려 하는 건가요?"
그는 말했지
"Oh! Do you come from a land down under (oh yeah yeah)
Where women glow and men plunder
Can't you hear, can't you hear the thunder
You'd better run, you'd better take cover."
오! 당신은 저 아래에 있는 땅에서 왔나요? (오 네 네)
여자들은 빛나게 예쁘고 남자들은 물건을 팔아먹는 곳
천둥소리가,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도망쳐요, 다른 곳으로 가는게 좋아요
2. 시드니
하나의 대륙이 하나의 나라인 호주는 면적이 남한의 77배에 이르는데 인구는 2천만이 조금 넘는 그래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호주는 알다시피 원주민들이 살던 곳에 영국의 죄수들이 이주해 오면서 근대적인 국가로 탄생했다. 호주에는 멜버른, 캔버라, 브리즈번 등의 여러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아마도 시드니는 그 중 가장 크고 유명한, 그래서 호주를 상징하는 도시일 테다.
호주하면 떠오르는 오페라 하우스로 상징되는 시드니는 인구 4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이고 또 샌프란시스코와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에 속한다. 그러나 막상 시드니에 가서 본 느낌은 시드니가 아름답기 이전에 천혜의 항구라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항구는 바다에 연해서 그저 둥그러한 만에 들어 앉은 도시를 생각하기 쉽상인데 시드니는 이런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도에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라 명명된 곶 사이로 깊숙이 들어 온 시드니만(포트잭슨만)은 그 안에 많은 조그마한 만(베이나 비치)들을 만들어 내고 그 만들과 어울린 한 구역에 시드니는 자리 잡고 있다. 포트잭슨만을 감싸 안고 있는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간의 직선 거리는 1.6km에 불과한데 그 안으로 아주 큰 배들도 다 들어 온다고 하니 태평양의 거친 바다로부터 항구를 보호하면서도 해심이 깊은 시드니는 천혜의 항구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노스헤드의 끝에서 바라보는 망망한 태평양과 그 안으로 깊숙이 자리잡은 시드니를 보고 있으면 마치 따뜻한 방안에서 저 밖에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창밖을 내다보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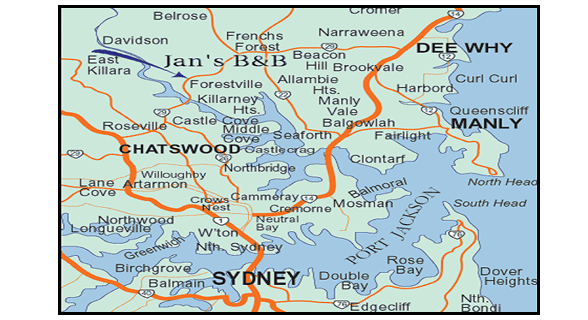
3. 오페라 하우스
호주하면 언제나 그 상징으로 떠오르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이다.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포트잭슨)만 위에 파일을 박아 만든 대지 위에 떠 있다. 오페라 하우스의 모양이 특이해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 모양이다. 혹자는 건축가인 덴마크의 요른 우츤이 부인이 썰어 놓은 오렌지 모양을 본떴다고도 하고 조가비 모양을 본떴다고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설명은 고딕 교회의 건축양식에 바람을 가득 담은 돛을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시드니가 세계 3대 미항으로 호주의 대표적인 항구이기에 이런 건축을 구상했으리라.
또 100미터 미인이라고 멀리서는 예쁘지만 가까이서는 보기가 썩 아름답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맑은 날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오페라 하우스는 참 아름다웠다. 11월이면 시드니의 초여름이라 따뜻한 햇살 아래 바다 바람이 살랑이는 느낌도 아주 좋았다. 이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1억2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건축 이후 이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바벨탑의 이야기처럼 건축이란 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형상화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아름다운 건축이 인간에게 주는 매력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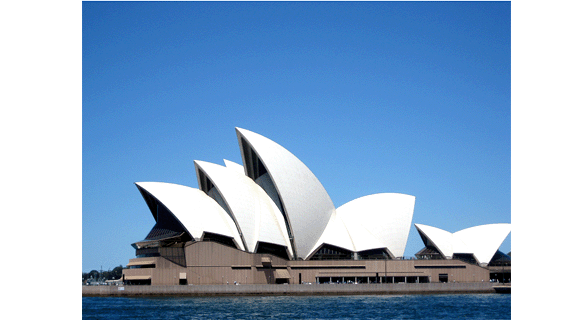
오페라 하우스 안에는 콘서트 홀과 오페라 극장 등 다양한 크기의 공연장이 있고 연간 무려 3,000건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열린단다. 비교적 현대의 건물이라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에도 무리가 없다. 현대적인 건물이라 그런지 아니면 남반구의 태양 아래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여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찾는 이에게 엄숙함을 요구하거나 인간의 영혼을 위한 어두움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고 서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사람들의 자신감이나 개방성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다.
4. 하버브리지
‘Old Coathanger’(낡은 옷걸이)라고도 불리는 하버브리지는 단일 아치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이다. 시드니 교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리로 포트 잭슨 만 위에 아치 모양으로 놓여져 있으며 시드니 중심가와 시드니의 북부를 연결하고 있다. 전체 길이는 1149m,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는 59m, 도로폭 49m의 철제다리이다. 1923년에 착공해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들여서 1932년에 완성했다한다. 하버 브리지 건설을 위해서 록스의 많은 부분이 깍여 나갔고 사라져 버렸지만 건설에 의해서 많은 고용이 발생, 노동자 계급의 가족을 대불황에서 구제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현지인들 사이에서 '철의 숨결'이란 애칭으로 불려지기도 했단다.
하버브리지를 지나다 보면 가끔 브리지의 아치위로 개미 같은 조그만한 점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버 브리지의 아치를 오르는 관광객들이다. 이 등반 코스는 안내 가이드가 8명의 인원을 인솔해서 올라가는데 간단한 교육도 하고 비용도 대략 15만원 가량이어서 비싼 편이며 전체 등반시간도 3시간 반 정도로 길다. 등반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로프가 달린 전용 회색 복장을 착용한다는데 장애인이 오르기에는 무리인 듯하다. 그러나 그 전망은 시드니의 도시 전체와 또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포트잭슨만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장관일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유명한 불꽃놀이가 벌어져 이를 보려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 온다고 한다.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거의 60m로 매우 높은 것은 배들이 하버브리지를 지나 포트잭슨만의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말로는 퀸엘리자베스 같은 크루즈 선들도 그 밑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 철강재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그 밑에 하얀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모던한 느낌의 오페라 하우스와 어우러져 한 층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5. 록스 마켓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록스 지역의 차도를 막고 프리마켓을 연다. 여기에는 모두 150여개의 조그마한 가게들이 들어서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호주의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판다. 독특한 그림들, 디자인 소품들, 포스터, 그릇제품, 호주 에보리진이 쓰는 악기, 에보리진이 만들었다고 보증서가 첨부된 조그마한 목각인형들을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다. 혹 전통적인 냄새가 날까하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예쁘기는 하지만 역사를 느끼기는 어렵다. 가격도 그리 싼 편은 아니어서 구경하는데만 신경이 쓰인다.

6. 달링하버
이름이 참 아름다운 달링하버, 석양이 드리우는 저녁 무렵의 달링하버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웠다. 또 달링하버는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코클베이라는 조그마한 만의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달링하버에는 남국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살아 있다. 차가 다닐 수 없이 설계된 널다란 인도에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는 쇼핑센터, 조그마한 공원들, 극장, 수족관들이 늘어서 있고 멋진 레스토랑들도 한번 쯤 들어가보길 유혹한다. 바닷가라도 바다 냄새가 그리 많이 나지 않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제법 큰 바다새들이 달링하버의 인도들과 상점의 안에까지 들어와 푸드덕 거린다. 그런데도 호주 사람들은 익숙한 듯 당황하지도 않는다.
달링하버지역은 옛날에는 조선소와 발전소 등이 있던 지역으로 도시의 발전으로 쇠퇴해 가던 지역을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시드니를 주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한 지역이다. 그 주변으로 숲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해서 지금은 많은 시드니 주민들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명소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이 2천8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7. 해변들
시드니는 바다를 연한 도시답게 많은 비치를 품에 안고 있다. 비치들은 시드니(포트잭슨)만 안쪽으로도 있고 태평양을 연하는 바깥쪽으로도 있다. 가장 유명한 비치는 본다이 비치인데 여름철에는 마치 부산의 해운대처럼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한다. ‘본다이’는 원주민말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라는 뜻인데 파도가 높아서 서퍼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맨리비치가 있고 포드잭슨 만안으로는 누드비치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비치들은 태평양에 연해 있거나 포트잭슨만안에 있더라도 물이 깊어서 그런지 파도가 높아서 수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이 옆구리에 서핑보드를 끼고 파도에 몸을 맡긴다. 시드니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한다는데 이 젊은이들의 무리에는 적지 않은 여성들도 볼 수가 있다.
8. North Head
시드니가 들어 앉아 있는 포트잭슨만과 그 드넓은 태평양을 경계짓는 곳이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다.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간의 직선거리는 1마일 정도에 불과해 마치 사람이 두팔을 벌려 항아리를 안고 있듯이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는 그 안에 포트잭슨만을 품고 있고 그 만안에 시드니가 들어 있다.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는 깍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그 경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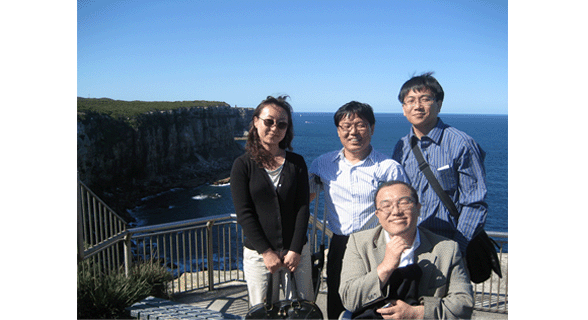
노스헤드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태평양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달래느라고 노스헤드 공원의 나무들은 옆으로 눕거나 높이 자라지 못했다. 노스헤드의 군데군데에는 바닷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 전망대에서 보는 태평양은 말 그대로 망망대해다. 저 멀리까지 섬하나 육지 한곳 보이지 않는 그 전망을 보고 있자면 ‘아! 여기가 태평양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보는 것으로는 그 광대한 느낌을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지식이 가르쳐주는대로 태평양의 그 광대함을 생각하면 여기가 그 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다가온다.
비록 시드니가 아름답고 볼만한 도시라할지라도 호주는 여전히 대륙이며 하나의 대륙이 보여주는 자연의 웅장함이 호주의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한다면 시드니의 노스헤드에서 보는 태평양은 그런 느낌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 태평양에는 때가 맞으면 고래들의 무리도 볼 수 있다고 한다.
9. 시드니의 교통
움푹 패인 만안에 남북 해변으로 시드니며 주변 도시들을 거느리고 있는 시드니는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그런데 의외로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나 터널은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까?
시드니에는 두 개의 독특한 교통체계가 있다. 보통 있는 버스나 기차, 혹은 지하철에 더하여 시드니의 교통에 윤활류를 주는 것이 둘 있는데 하나는 만을 가로질러 왕래하는 페리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을 도는 모노레일이다.
시드니에서 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보는 왓슨베이와 노스헤드 근처의 맨리 사이를 육로를 통해 가려면 만의 끝부분인 파라마타까지 가서 돌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못 해도 몇십분은 가야 하지만 페리를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페리는 시드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지만 시드니시민들도 보통 이용하는 요긴한 출퇴근 수단이다. 시내 한복판의 서쿨라키라는 페리역에서 포트잭슨만 안에 있는 많은 부심들을 연결하는 여러 종류의 페리가 있다. 다만 페리의 가격은 한 번 이용하는데 우리돈으로 4천원, 10번을 이용하는 할인권이 2만5천원으로 비싼 편이다.
시드니의 모노레일은 대략 8개 정도의 역을 한 20분내에 도는 일종의 관광열차 같은 느낌이다. 열차도 2-3량 정도라서 많은 인원을 실어 나르지는 않는다. 도심의 좁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한 교통체계이다. 그러나 이 모노레일 역시 한번 타는데 4천원 가까워서 비싼 편이다. 모노레일은 휠체어 장애인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페리는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10. 오래되지 않은 과거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 나는 인천의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한 것인데 당시만 해도 일반 시민단체들은 재정적인 혹은 정부의 탄압으로 쉽게 활동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말단 간사로서 속속들이 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인천 산업선교회의 재정에는 외국의 도움이 컸다. 특히 독일에서의 재정적 후원이 거의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인천과 영등포가 유명했다.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위력은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교포들 중에서 혹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Debbie Carstens'. 그녀는 호주사람으로 한국을 찾아온 전도사였다. 그녀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잡일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한편, 호주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했다. 나는 그녀의 한국말 선생이었다. 미국영어보다 호주 영어의 모음이 더 크고 더 깊은 곳에서 발성이 되어서인지 그녀는 발음도 좋았고 한국말도 매우 빨리 배웠다. 같이 가르치던 한국계 미국인보다도 발음도 좋고 더 빨리 배우기도 해서 나에게는 좋은 학생이었다. 그녀는 또한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이 수수하고 지극히 한국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이메일 이름을 'Downunde‘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녀를 비롯한 호주에서 온 내 친구들을 생각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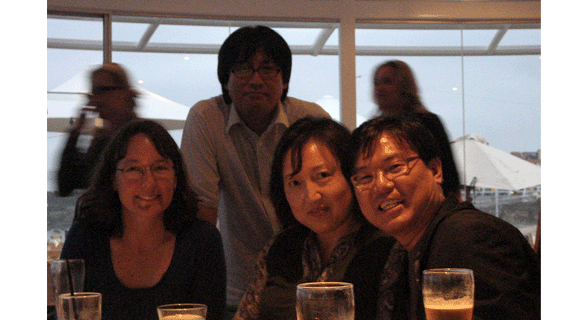
그녀가 한국을 떠나서 자신의 고국인 호주로 돌아간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번 호주 여행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10년전에 그렇게 배운 한국말과 운동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호주에 온 아시아계 이민여성노동자를 위한 단체(Asian Women at Work)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 겸손한 태도, 10년이 지났어도 잊지 않은 한국말, 그녀는 내 기억속에 오래되지 않았어도 잊혀졌던 과거를 되살려 냈다. 내가 그 시절에 생각했던 것들은 어디에 있고 나는 얼마나 쉽게 그 과거로부터 멀어져 왔나?
‘차민희’ 이것이 그녀의 한국말 이름인데 그녀를 닮은 예쁜 딸과 아들과 함께 그녀가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빈다.
그러나 인터넷의 시대로 오면서 우리는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호를 갖게 되었다. 바로 e-mail 때문이다. 이메일의 광범위한 사용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새로운 이름짓기-환경이다. 이메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만들어진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지어보는 새로운 경험을 안겨 주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본 이름을 그냥 영어로 쓰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저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기도 한다.
벌써 10여년이 지난 언젠가 신문물에 그닥 민감하지 못했던 나도 뒤늦게 이메일 이름을 지어야 했고 그 때 지은 이메일 이름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 이름이 ‘downunde’이다. 원래 짓고 싶었던 이름은 'downunder'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메일 이름을 8자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서 마지막 'r'을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아직도 사용하는 이메일 이름을 ‘downunde'라고 지었던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었다. 그 하나는 오랜전에 좋아했던 호주출신의 뉴웨이브 밴드 'Men at Work'의 히트곡 ‘Downunder' 때문이었다. 'Men at Work'는 198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호주 출신의 록밴드였는데 단순한 악기 편성과 코드편성, 그리고 조금은 불협화음 같은 음들을 교묘하게 버무려서 쉬운면서도 약간은 펑키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모던 락 밴드였다. 남미 토속 음악의 멜로디를 차용한 듯한 플룻 연주와 레게 리듬이 빚어내는 이 곡의 독특한 스타일은 이 곡이 전세계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이들은 첫앨범 ’Business as Usual'(1982)에서 두 개의 빌보드 1위곡들 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Downunder'였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의 지리적 특성을 뜻하는 별칭인 "Down Under"라는 노래가 호주인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사회의 죄수들, 한마디로 유럽에서 방출된 쓰레기들이 건너가 세운 나라의 국민으로서 그들이 품을 수밖에 없는 뿌리 깊은 열등의식과 애환을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에 잘 담아낸 곡이기 때문이다. 일종의 자기위로인 셈인데 가사를 음미하면 이해가 쉽다. 나는 ‘아래’라는 뜻이 중복되는 이 노래의 제목에서 당시의 내 처지나 지향을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지난 2000년 호주 시드니 올림픽 폐막 행사 때도 ‘Men At Work’는 메인 무대에 올라 'Down Under'를 불렀다고 한다.
Travelling in a fried-out Kombi
On a hippie trail, head full of zombie
I met a strange lady, she made me nervous
She took me in and gave me breakfast
And she said,
푹푹 찌는 화물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히피처럼 다녔지. 머리 속은 좀비나 다름없었는데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날 긴장케 했지
그녀는 날 초대하고 아침식사를 주곤 말했지
"Do you come from a land down under
Where women glow and men plunder
Can't you hear, can't you hear the thunder
You'd better run, you'd better take cover."
당신은 저 아래에 있는 땅에서 왔나요?
여자들은 빛나게 예쁘고 남자들은 물건을 팔아먹는 곳
천둥소리가,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도망쳐요, 다른 곳으로 가는게 좋아요
Buying bread from a man in Brussels
He was six foot four and full of muscle
I said, "Do you speak-a my language?"
He just smiled and gave me a Vegemite sandwich
And he said,
브뤼셀(벨기에)에서 온 남자에게서 빵을 샀어
키는 6피트 4인치(190cm)에 근육질이었어
난 말했지 "우리 나라 말을 할 줄 아시나요?"
그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내게 야채 샌드위치를 주고
말하더군
"I come from a land down under
Where beer does flow and men chunder
Can't you hear, can't you hear the thunder
You'd better run, you'd better take cover."
난 저 아래에 있는 땅에서 왔죠
맥주가 강처럼 흐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노는 곳(실제로는 토한다는 뜻임)
천둥소리가,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도망쳐요,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아요
Lying in a den in Bombay
Slack jaw, not much to say
I said to the man, "Are you trying to tempt me
Because I come from the land of plenty?"
And he said,
봄베이(인도)의 굴에 누워서
턱도 축 늘어졌고, 할 말도 없었어
난 옆의 남자에게 말했지 "내가 풍족한 땅에서
왔다는 걸 알고 현혹하려 하는 건가요?"
그는 말했지
"Oh! Do you come from a land down under (oh yeah yeah)
Where women glow and men plunder
Can't you hear, can't you hear the thunder
You'd better run, you'd better take cover."
오! 당신은 저 아래에 있는 땅에서 왔나요? (오 네 네)
여자들은 빛나게 예쁘고 남자들은 물건을 팔아먹는 곳
천둥소리가, 천둥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도망쳐요, 다른 곳으로 가는게 좋아요
2. 시드니
하나의 대륙이 하나의 나라인 호주는 면적이 남한의 77배에 이르는데 인구는 2천만이 조금 넘는 그래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호주는 알다시피 원주민들이 살던 곳에 영국의 죄수들이 이주해 오면서 근대적인 국가로 탄생했다. 호주에는 멜버른, 캔버라, 브리즈번 등의 여러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아마도 시드니는 그 중 가장 크고 유명한, 그래서 호주를 상징하는 도시일 테다.
호주하면 떠오르는 오페라 하우스로 상징되는 시드니는 인구 400만이 넘는 거대 도시이고 또 샌프란시스코와 리우데자네이루와 함께 세계 3대 미항에 속한다. 그러나 막상 시드니에 가서 본 느낌은 시드니가 아름답기 이전에 천혜의 항구라는 느낌이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항구는 바다에 연해서 그저 둥그러한 만에 들어 앉은 도시를 생각하기 쉽상인데 시드니는 이런 상상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도에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라 명명된 곶 사이로 깊숙이 들어 온 시드니만(포트잭슨만)은 그 안에 많은 조그마한 만(베이나 비치)들을 만들어 내고 그 만들과 어울린 한 구역에 시드니는 자리 잡고 있다. 포트잭슨만을 감싸 안고 있는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간의 직선 거리는 1.6km에 불과한데 그 안으로 아주 큰 배들도 다 들어 온다고 하니 태평양의 거친 바다로부터 항구를 보호하면서도 해심이 깊은 시드니는 천혜의 항구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노스헤드의 끝에서 바라보는 망망한 태평양과 그 안으로 깊숙이 자리잡은 시드니를 보고 있으면 마치 따뜻한 방안에서 저 밖에 폭풍과 눈보라가 몰아치는 창밖을 내다보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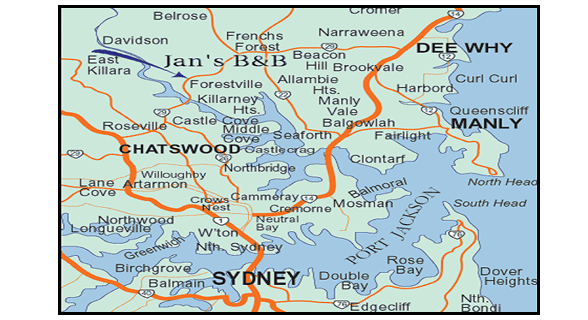
3. 오페라 하우스
호주하면 언제나 그 상징으로 떠오르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이다. 오페라 하우스는 시드니(포트잭슨)만 위에 파일을 박아 만든 대지 위에 떠 있다. 오페라 하우스의 모양이 특이해서 여러 가지 설이 분분한 모양이다. 혹자는 건축가인 덴마크의 요른 우츤이 부인이 썰어 놓은 오렌지 모양을 본떴다고도 하고 조가비 모양을 본떴다고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설명은 고딕 교회의 건축양식에 바람을 가득 담은 돛을 형상화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시드니가 세계 3대 미항으로 호주의 대표적인 항구이기에 이런 건축을 구상했으리라.
또 100미터 미인이라고 멀리서는 예쁘지만 가까이서는 보기가 썩 아름답지 않다는 말도 있는데 맑은 날 바다 위에 떠 있는 듯한 오페라 하우스는 참 아름다웠다. 11월이면 시드니의 초여름이라 따뜻한 햇살 아래 바다 바람이 살랑이는 느낌도 아주 좋았다. 이 오페라 하우스를 짓는데 1억2천만 달러 정도가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건축 이후 이 오페라 하우스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바벨탑의 이야기처럼 건축이란 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형상화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 아름다운 건축이 인간에게 주는 매력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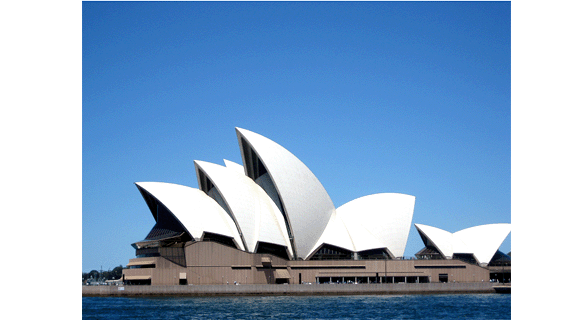
오페라 하우스 안에는 콘서트 홀과 오페라 극장 등 다양한 크기의 공연장이 있고 연간 무려 3,000건에 달하는 다양한 분야의 공연이 열린단다. 비교적 현대의 건물이라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에도 무리가 없다. 현대적인 건물이라 그런지 아니면 남반구의 태양 아래 지어진 건물이라 그런지 여느 기념비적인 건축물들과는 다르게 찾는 이에게 엄숙함을 요구하거나 인간의 영혼을 위한 어두움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는다.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고 서 있는 오페라 하우스는 호주 사람들의 자신감이나 개방성을 표현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다.
4. 하버브리지
‘Old Coathanger’(낡은 옷걸이)라고도 불리는 하버브리지는 단일 아치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다리이다. 시드니 교통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리로 포트 잭슨 만 위에 아치 모양으로 놓여져 있으며 시드니 중심가와 시드니의 북부를 연결하고 있다. 전체 길이는 1149m,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는 59m, 도로폭 49m의 철제다리이다. 1923년에 착공해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들여서 1932년에 완성했다한다. 하버 브리지 건설을 위해서 록스의 많은 부분이 깍여 나갔고 사라져 버렸지만 건설에 의해서 많은 고용이 발생, 노동자 계급의 가족을 대불황에서 구제했다고 한다. 그 때문에 현지인들 사이에서 '철의 숨결'이란 애칭으로 불려지기도 했단다.
하버브리지를 지나다 보면 가끔 브리지의 아치위로 개미 같은 조그만한 점들이 일렬로 줄을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버 브리지의 아치를 오르는 관광객들이다. 이 등반 코스는 안내 가이드가 8명의 인원을 인솔해서 올라가는데 간단한 교육도 하고 비용도 대략 15만원 가량이어서 비싼 편이며 전체 등반시간도 3시간 반 정도로 길다. 등반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로프가 달린 전용 회색 복장을 착용한다는데 장애인이 오르기에는 무리인 듯하다. 그러나 그 전망은 시드니의 도시 전체와 또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포트잭슨만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장관일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유명한 불꽃놀이가 벌어져 이를 보려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몰려 온다고 한다.
해면에서 도로까지의 높이가 거의 60m로 매우 높은 것은 배들이 하버브리지를 지나 포트잭슨만의 깊숙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말로는 퀸엘리자베스 같은 크루즈 선들도 그 밑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한다. 철강재로 이루어진 이 다리는 그 밑에 하얀 세라믹으로 이루어진 모던한 느낌의 오페라 하우스와 어우러져 한 층 그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5. 록스 마켓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록스 지역의 차도를 막고 프리마켓을 연다. 여기에는 모두 150여개의 조그마한 가게들이 들어서는데 대부분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호주의 상징물들을 만들어서 판다. 독특한 그림들, 디자인 소품들, 포스터, 그릇제품, 호주 에보리진이 쓰는 악기, 에보리진이 만들었다고 보증서가 첨부된 조그마한 목각인형들을 파는 가게가 줄지어 있다. 혹 전통적인 냄새가 날까하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예쁘기는 하지만 역사를 느끼기는 어렵다. 가격도 그리 싼 편은 아니어서 구경하는데만 신경이 쓰인다.

6. 달링하버
이름이 참 아름다운 달링하버, 석양이 드리우는 저녁 무렵의 달링하버는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웠다. 또 달링하버는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코클베이라는 조그마한 만의 양 옆으로 늘어서 있는 달링하버에는 남국의 젊음과 아름다움이 살아 있다. 차가 다닐 수 없이 설계된 널다란 인도에는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앉아 있고 그 주변으로는 쇼핑센터, 조그마한 공원들, 극장, 수족관들이 늘어서 있고 멋진 레스토랑들도 한번 쯤 들어가보길 유혹한다. 바닷가라도 바다 냄새가 그리 많이 나지 않지만 어디선가 날아온 제법 큰 바다새들이 달링하버의 인도들과 상점의 안에까지 들어와 푸드덕 거린다. 그런데도 호주 사람들은 익숙한 듯 당황하지도 않는다.
달링하버지역은 옛날에는 조선소와 발전소 등이 있던 지역으로 도시의 발전으로 쇠퇴해 가던 지역을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가 ‘시드니를 주민에게 돌려주자’라는 슬로건 아래 개발한 지역이다. 그 주변으로 숲을 조성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유치해서 지금은 많은 시드니 주민들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 오는 명소가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이 2천8백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7. 해변들
시드니는 바다를 연한 도시답게 많은 비치를 품에 안고 있다. 비치들은 시드니(포트잭슨)만 안쪽으로도 있고 태평양을 연하는 바깥쪽으로도 있다. 가장 유명한 비치는 본다이 비치인데 여름철에는 마치 부산의 해운대처럼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한다. ‘본다이’는 원주민말로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라는 뜻인데 파도가 높아서 서퍼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그 외에도 맨리비치가 있고 포드잭슨 만안으로는 누드비치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비치들은 태평양에 연해 있거나 포트잭슨만안에 있더라도 물이 깊어서 그런지 파도가 높아서 수영을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많은 젊은이들이 옆구리에 서핑보드를 끼고 파도에 몸을 맡긴다. 시드니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한다는데 이 젊은이들의 무리에는 적지 않은 여성들도 볼 수가 있다.
8. North Head
시드니가 들어 앉아 있는 포트잭슨만과 그 드넓은 태평양을 경계짓는 곳이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다.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간의 직선거리는 1마일 정도에 불과해 마치 사람이 두팔을 벌려 항아리를 안고 있듯이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는 그 안에 포트잭슨만을 품고 있고 그 만안에 시드니가 들어 있다. 노스헤드와 사우스헤드는 깍아지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그 경계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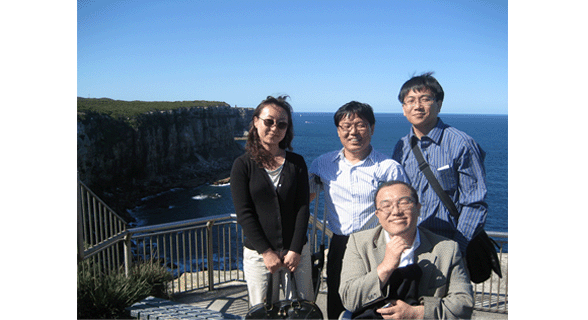
노스헤드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태평양에서 불어 오는 바람을 달래느라고 노스헤드 공원의 나무들은 옆으로 눕거나 높이 자라지 못했다. 노스헤드의 군데군데에는 바닷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 전망대에서 보는 태평양은 말 그대로 망망대해다. 저 멀리까지 섬하나 육지 한곳 보이지 않는 그 전망을 보고 있자면 ‘아! 여기가 태평양인가’하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보는 것으로는 그 광대한 느낌을 다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의 지식이 가르쳐주는대로 태평양의 그 광대함을 생각하면 여기가 그 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다가온다.
비록 시드니가 아름답고 볼만한 도시라할지라도 호주는 여전히 대륙이며 하나의 대륙이 보여주는 자연의 웅장함이 호주의 가장 큰 볼거리라고 한다면 시드니의 노스헤드에서 보는 태평양은 그런 느낌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그 태평양에는 때가 맞으면 고래들의 무리도 볼 수 있다고 한다.
9. 시드니의 교통
움푹 패인 만안에 남북 해변으로 시드니며 주변 도시들을 거느리고 있는 시드니는 교통에 많은 문제가 있으리라는 짐작을 하게 한다. 그런데 의외로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나 터널은그리 많지 않다. 그러면 그 많은 교통량을 어떻게 감당할까?
시드니에는 두 개의 독특한 교통체계가 있다. 보통 있는 버스나 기차, 혹은 지하철에 더하여 시드니의 교통에 윤활류를 주는 것이 둘 있는데 하나는 만을 가로질러 왕래하는 페리이고 다른 하나는 도심을 도는 모노레일이다.
시드니에서 만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마주보는 왓슨베이와 노스헤드 근처의 맨리 사이를 육로를 통해 가려면 만의 끝부분인 파라마타까지 가서 돌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못 해도 몇십분은 가야 하지만 페리를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다고 한다. 때문에 페리는 시드니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지만 시드니시민들도 보통 이용하는 요긴한 출퇴근 수단이다. 시내 한복판의 서쿨라키라는 페리역에서 포트잭슨만 안에 있는 많은 부심들을 연결하는 여러 종류의 페리가 있다. 다만 페리의 가격은 한 번 이용하는데 우리돈으로 4천원, 10번을 이용하는 할인권이 2만5천원으로 비싼 편이다.
시드니의 모노레일은 대략 8개 정도의 역을 한 20분내에 도는 일종의 관광열차 같은 느낌이다. 열차도 2-3량 정도라서 많은 인원을 실어 나르지는 않는다. 도심의 좁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편한 교통체계이다. 그러나 이 모노레일 역시 한번 타는데 4천원 가까워서 비싼 편이다. 모노레일은 휠체어 장애인도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페리는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10. 오래되지 않은 과거
불과 20년도 되지 않은 과거에 나는 인천의 도시산업선교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단체에서 일을 시작한 것인데 당시만 해도 일반 시민단체들은 재정적인 혹은 정부의 탄압으로 쉽게 활동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말단 간사로서 속속들이 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인천 산업선교회의 재정에는 외국의 도움이 컸다. 특히 독일에서의 재정적 후원이 거의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도시산업선교회는 인천과 영등포가 유명했다.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위력은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외국에 사는 교포들 중에서 혹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Debbie Carstens'. 그녀는 호주사람으로 한국을 찾아온 전도사였다. 그녀는 영등포 산업선교회에서 잡일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한편, 호주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관심을 갖도록 노력했다. 나는 그녀의 한국말 선생이었다. 미국영어보다 호주 영어의 모음이 더 크고 더 깊은 곳에서 발성이 되어서인지 그녀는 발음도 좋았고 한국말도 매우 빨리 배웠다. 같이 가르치던 한국계 미국인보다도 발음도 좋고 더 빨리 배우기도 해서 나에게는 좋은 학생이었다. 그녀는 또한 선진국에서 온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이 수수하고 지극히 한국적인 사람이었다. 내가 이메일 이름을 'Downunde‘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녀를 비롯한 호주에서 온 내 친구들을 생각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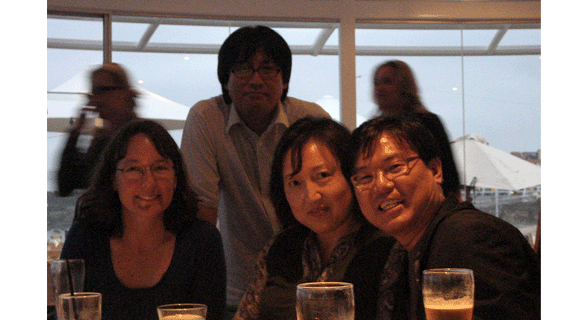
그녀가 한국을 떠나서 자신의 고국인 호주로 돌아간 지가 10년이 넘었다. 그리고 이번 호주 여행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10년전에 그렇게 배운 한국말과 운동을 잊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호주에 온 아시아계 이민여성노동자를 위한 단체(Asian Women at Work)에서 일하고 있었다. 수수한 옷차림, 겸손한 태도, 10년이 지났어도 잊지 않은 한국말, 그녀는 내 기억속에 오래되지 않았어도 잊혀졌던 과거를 되살려 냈다. 내가 그 시절에 생각했던 것들은 어디에 있고 나는 얼마나 쉽게 그 과거로부터 멀어져 왔나?
‘차민희’ 이것이 그녀의 한국말 이름인데 그녀를 닮은 예쁜 딸과 아들과 함께 그녀가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를 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