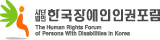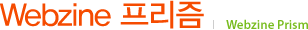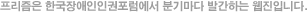‘미국 캔사스대학(KU) 자립생활연구소(RTCIL) 연수기’ 고관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 대표)
미국에서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를 마치고 귀국해, 강남역 근처의 고시원에 둥지를 튼 것도 어느덧 3개월이 지나 간다.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짧지만 많은 추억을 기억 속에 갈무리하면서 자립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었다. 어쩌면 지금 다시 그 여정을 되새겨본다는 것은 미국의 자립생활을 만나는 과정, 어느 지점에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지도 모른다.
자립생활의 고향, 미국의 자립생활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과 동료 서포터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인터뷰를 시작했지만, 나는 처음부터 1970년도의 미국에 머물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것은 한국에서 연구계획을 세울 때부터 잡았던 10개의 미국자립생활의 초기센터들이 아직까지 건재하고 많은 역사적 전통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는, 그래서 더 많고 확실한 미국자립생활에 대해서 배울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던 탓이리라.
그러나 글랜박사는 “그때의 그 센터와 똑같은 센터가 아니다.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꿨다”라는 말로 내 환상에 주의를 주었다. ‘변화’였다. 모든 것이 변했다는 것이다. 초기 자립생활센터를 시작한 사람들도 없고, 모습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사회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읽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 우리는 미국의 70년대의 자립생활센터에서 멈춰선 것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의 자립생활센터에서 내가 읽어야 할 것은 미국의 자립생활의 ‘변화’인 것이다.
이제 2회에 걸쳐 웹진 프리즘의 지면을 통해 인터뷰를 위해 방문했던 미국의 몇몇 특징적인 자립생활센터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거대 백인사회에서 아시아 장애인들의 대피소 -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리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일단, 인터뷰 여행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우선적으로 먼 곳에 있는 센터들을 방문하자고 갔던 곳이 바로 로스엔젤리스시의 자립생활센터인데 시의 중심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으며, 내가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잠시 방문했던 그 센터이기도 하다. 먼거리인 관계로 비행기로 왕복하면서도 3일의 일정을 잡아야만 했다. 필리핀계 아시아 여성중증장애인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렇게 큰 대도시의 센터로서는 생긴 지 얼마 안된 신생 센터라는 것이다.
만들어진 계기가 비극적이었다. 자립생활운동 초기에 만들어진 30년 된 기존의 자립생활센터가 내부부정과 비리가 발각되어 시로부터 고소당하면서 폐쇄되자 그 대안으로서 몇 년 전에 세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 넉넉하진 못하지만, 시와 주의 지원사업과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한다. 물론 활동보조파견사업은 하지 않으며, 그 대신 지역장애인 교육과 정보제공, 동료상담을 기반으로한 개인별 권익옹호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방문한 모든 방문한 미국센터들의 공통된 대답이었다. 그렇지만 특이한 것은, 아시아계가 많은 지역적 특성처럼, 필리핀인과 한국인등의 아시아계 직원들과 활동가들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백인중심의 사회에 자그마한 아시안계 장애인들의 대피소 같은 인상을 받았다.

40년 가까운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 초기 자립생활센터중에 하나인 시카고 액세스 리빙을 방문하는 것은 나를 많은 설래임과 기대감에 부풀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캔사스의 로렌스로부터 10시간을 달려 도착한 미국 최대의 도시 시카고는 12월 중순의 날씨와 더불어 ‘바람의 도시’다웁게 오대호 연안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덕에 꽤나 쌀쌀한 겨울을 예고하고 있었다.
전날 도착하여 한국찜질방에 여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튿날, 통역을 맡은 일리노이 시카고대학의 장애학과 박사과정을 다니는 한국유학생을 만나, 그 유명한 시카고 피자로 점심을 때우고, 인터뷰 시간에 맞추어 인근에 있는 액세스 리빙을 방문하였다. 그곳은 다운타운 중심부로 빌딩가에 자리잡은 4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원래는 최근까지 다른 건물의 1층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기부금과 수익금을 모아서 새로 자체건물을 지어 입주한지 얼마 안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건물이 얼마나 장애접근성과 친환경성을 갖추고 지어졌는지를 그해 최고의 관련 건축상을 받은 기념표지판 앞에 서서 ‘리비 패트릭’이 설명해 주었다. 그녀는 손과 다리가 불편한 젊은 여성 중증장애인으로 미국 자립생활운동의 젊은 기수라 할 것이다.
현재의 센터장은 초기 센터 설립을 주도했던 마르카 브리스토라는 척수장애여성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번 초대하여 강연회를 가졌을 정도로 미국내의 자립생활영역에서도 유명한 인사이다. 그리고 그녀는 NCIL(National Council on Independent Living)이라는 전미자립생활협의회의 주요 맴버로 현재 미국내의 연방차원의 자립생활정책과 법제도를 제·개정 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왕성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부소장의 역할을 하며, 지역 내의 권익옹호를 활발히 하고 있는 ‘리비 패트릭’을 만나게 된 것이다.
그녀는 대학을 나오고 ‘어답트’라는 장애인권익옹호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억세스 리빙으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도 청년장애인 권익옹호활동과 동료상담, 동료서포트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권익옹호에 잔뼈가 굵은 셈이다.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3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갔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보다는 ‘브라더’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역시 장애라는 것만으로도 나라와 언어, 인종을 떠나서 이렇게 친근해질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다.
인터뷰를 끝내고 나서 센터를 둘러보았다. 장애인 직원들이 곳곳에 보이고, 센터가 넓고 환한 것이 너무 부러웠다. 인상에 남는 것은 청년 장애인들을 위한 자조모임실을 따로 만들어 그들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벽에 걸려있는 ‘Power to the people (사람들을 강력하게 하자)’라는 현수막을 보면서 40년이 지났지만 미국 자립생활운동의 중심인 권익운동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인터뷰 다음날, 통역사의 안내로 그녀가 다니는 일리노이 주립 시카고대학에 있는 미국 최초의 ‘ADA 지원센터’와 장애관련 학과를 둘러보면서 내 스스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이곳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도 같이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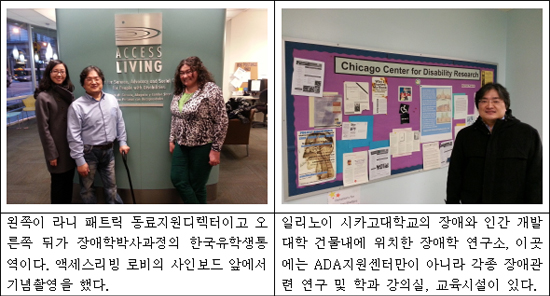
호울 퍼슨(The Whole Person)은 미주리주의 대도시 캔사스시티의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초대형센터로서 커다란 4층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다. 2012년까지는 캔사스주와 미주리주에 걸쳐서 3개의 지역에 나누어져 있던 센터들이 해를 넘기면서 하나의 건물로 통합이 된 것이다. 내가 처음 갔을 때가 통합이주한지 일주일도 채 안된 시기로 사무공간들이 아직 공사 중 이었다.
이 센터는 1978년에 설립되어 지금 3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전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거주, 비영리 법인이다. 현재의 센터장은 청각장애인으로서 처음에는 글렌박사가 인터뷰에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하였으나, 직접 만나고 나니 인공와우 수술 덕분에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동료상담에 대한 인터뷰 요청을 하였을 때 선뜻 응해 주었는데, 그것은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의 동료상담이란 교육여부에 상관없이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들끼리 서로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나누는 대화였던 것이다. 그래서 상담은 장애인들에게 일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담과 동료지원에 관한 인터뷰항목을 마련하여 갔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 상담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총괄하는 장애인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였고, 그러면 그와 관련한 메니져를 연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성장애인인 부 센터장으로부터 센터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라운딩을 받은 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겨울이 지나갈 무렵인 두 달여 후에 인터뷰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방문하게 되었는데, 두 분의 비장애인으로 보이는 담당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심 동료지지를 하는 업무특성상 장애인을 만나고 싶었기에 혹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두 사람 모두 우을증과 관련된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하는 내내, 이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전혀 장애기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정신장애를 사회활동이 심각히 저해될 정도에 한하여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와 이를 누구나 갈 수 있고 쉽게 예방차원에서라도 언제든지 정신과의 치료를 요청하는 사회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러면서도 장애인으로서의 여러 문제들에 공감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놀랄 따름이었다.
또한 이 센터는 지역 텔레비전에 지역장애인들이 자신들의 센터를 이용해 달라는, 그리고 자신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홍보 방송을 꾸준히 내보내고 있었다.

나는 미국에서 한국의 자립생활이 가야할 미래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생활의 고향에 여전히 우리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자립생활의 모습이 남아있기를 바랬던 모양이다. 내가 미국에서 느꼈던 자립생활에 대한 새로운 느낌들.
이번 지면에서는 여기까지 갈음하고, 다음 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