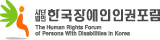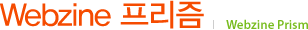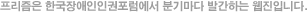‘미국 캔사스대학(KU) 자립생활연구소(RTCIL) 연수기’ 고관철 대표 (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이국만리, 미국에 온 것이 벌써 1년이 다 되간다. 원래 예정은 작년 9월 1일부터 올해 5월 30일까지 10개월이었지만, 연구의 성과를 위해 연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지도교수 글랜 박사의 의견에 따라 9월 20일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했다.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조급한 마음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다.

< 그림 1 : 캔사스대학 행정중심지 스트롱홀 >
미국에 막 도착했을 때, 난 단지 영어를 못하는 한사람의 외국인일 뿐이었다. 언어장벽의 문제를 겪으며, 자신감을 잃고 심각한 불안감에 빠졌었다. 외국인이 대학이나 대학원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요구하는 토플테스트를 통과하거나 캔사스대학(KU) 부설의 어학원인 AEC(Applied English Center-응용영어교육원)에 입학하여 대학이 정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물론 교육의 질은 만족할 만하고. 어학원에 등록하면 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격도 부여된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다. 한 학기 등록금이 1만불(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원이 넘는다)이나 되었다. 또한 한 학기에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나의 경우는 강의를 듣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학원을 다닐 만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개인적으로 영어 과외를 받는 것으로 언어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언어로 인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활을 해야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이곳 미국까지 와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무작정 시간을 들여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던 것이다. 나는 미국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연구가 나의 본래의 목적인 것을 상기하면서 이를 위해 학교의 체류허가를 받았고, 지도 교수로부터 연구실도 배정받았다.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는 것은 또 다른 도전의 연속이었다.

< 그림 2 : 처음 배정 받았던 연구실과 연구실에서의 필자 >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아규룸(Argueroom)이라는 곳에 모여서 일주일동안 서로가 진행하는 연구 및 행사 등에 대해서 토론하고 고지한다. 글랜 박사가 주도하는 지도학생들을 위한 정기주례회의다. 회의는 당연히 영어로 진행되고, 나를 제외하고 모두 영어에 능숙하다.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한국 유학생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아무래도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모두 자신이 진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듣고 기록한다. 하지만 나는 어떤 내용을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 외에 구체적 진행과정이나 특히 이 학교의 연구프로세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에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부터가 커다란 과제였다. 이런 나를 위해 글랜 박사는 점심마다 나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나의 서툰 영어를 감안해 이야기를 나눠 주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할 것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짧은 영어에도 ‘Independent Living(자립생활)’이라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의 상황, 일본의 상황 등에 대해서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고, 또한 미국의 자립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관심영역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다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글랜 박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연구영역에 대해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또한 연구과정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지적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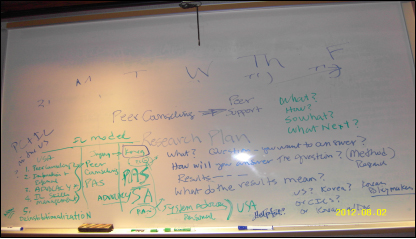
< 그림 3 :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With. 글랜 박사 >
연구계획을 작성해 가면서, 연구방법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했다. 마침 한국 삼육대의 윤재영교수가 보내준 자료로 영국 등 유럽의 장애학 연구방법론인 ‘해방적 장애연구(Emancipatory Disability Research) 방법론’과 글랜 박사가 주장하는 연구방법론인 ‘연구와 행동의 협업자로서의 장애인소비자’라는 장애인참여 연구방법론에 대한 비교학습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의 준비과정에 자신감이 생겼다. 하지만 또 다른 도전과제가 내 앞에 나타났다.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구진행에 대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대학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학 내의 인문, 사회, 자연의 모든 연구영역을 관리하는 휴먼리서치센터라는 곳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우리나라 풍토와는 많이 달랐다. 우리나라는 연구자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결과까지 도출하고 나서 이를 논문화해서 제출하고, 개인적 친분이 강하게 작용하는 지도교수의 넉넉한 인품과 사회적 작용력에 따라서 그 논문이 타당한가를 검토 받으면 되었었다. 그리고 연구 진행과정 시에 지급되는 조사비용이나 자료관리 등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정해서 진행하면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일정한 조사비용에 대한 명확한 언급과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도 분명히 명시하지 않고서는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최초 나의 계획이라는 것은 미국 각처에 산재되어있는 자립생활센터들 중에서 특히 70년대에 만들어진 초기 센터들을 방문해서 그들의 역사 및 서비스 등을 조사하고 미국 자립생활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파악해, 한국의 그것과 비교해 보겠다는 막연한 생각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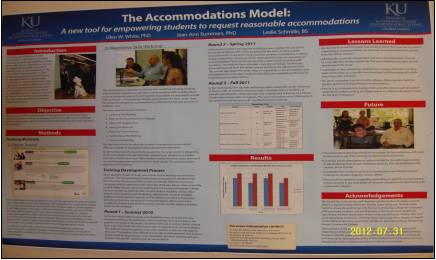
< 그림 4 : 연구소의 연구자료 >
하나의 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2박 3일을 가야하는 대륙의 지리적 한계와 30년이라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현실적 실현이 불가능함을 지적받았고, 또한 비행기, 숙박료 등 연구비용등, 한국에서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제약이 산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우선 나는 연구범위를 캔사스주 내의 센터들로 한정하고, 대도시 센터 몇 군데를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인터뷰의 대상을 센터에서 일하는 장애인당사자 센터장이나 매니저로 한정 했다. 인터뷰 비용을 일인당 50불 지불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 비용은 계획에 없던 비용이어서, 인터뷰에 대한 필사비용과 더불어 연구비 전체예산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의 연구계획은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었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연구계획 수립은 10월 말에 드디어 학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는 동안, 캠퍼스의 나무들이 화려한 색깔의 가운을 걸치고, 거리에 낙엽들이 뒹굴기 시작하면서 가장 멋진 로렌스의 가을을 맞이했다. 이렇게 좌충우돌의 3개월이 지나고, 11월 13일 드디어 나의 연구가 승인되었다.

< 그림 5 : 국제방문학자로 필자의 이름이 등록된 연구소 게시판 >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음 미국에 도착해 느꼈던 답답함과 암담함. 한국과 다른 문화에 느꼈던 불안감 속에서도 나는 살 수 있었고, 내가 미국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다. 처음 막연했던 생각은 이제 현실적으로 다듬어졌지만... 미국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기뻤다.

< 그림 6 : 캔사스 대학의 가을 풍경 >
지금까지도 미국에서의 생활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점에 선 기분이 되었다. 자. 새로운 시작점에서... 나의 연구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