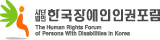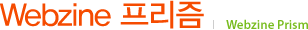- 포럼칼럼
-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의 의미와 전망
- 인권 REPORT
- 국제장이인권리협약제정에 따른 정부의 역할 조망
-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수용 및 이행의제문제
- 컬쳐포유
- 김은균의 문화풍경
- 문화 에세이
- 포토 에세이
- 시네라리아를 찾아서
- 현안칼럼
- 사라지는 LPG정책
- 시선과 소통
- 연대의 시선
- 현장통신
- 장애인 활동보조
- 활동 보조인
- 정책 제언
- 포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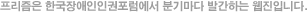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의아한데 그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었던 경험이 있다. 가령 학창시절 학교를 가려고 집에서 출발하여 학교에 도달하면 대충 40분정도가 걸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걸어서 다녔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올해부터 없어지는 신촌 기차 길을 걸어 땡땡 거리 사거리를 지나 철길을 걸어서 학교에 등교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경성중학이 위치한 연남동까지 이어지는 길은 지금도 버스로 20-30분은 족히 걸리는 매우 먼 길이었는데 그 길을 매일, 그것도 철길로만 통학길로 이용한 것은 지금 생각해도 참 이상한 일이다. 간혹 차가 있는 지호 네를 만나면 차를 얻어 탔었는데 당시 포니보다 조금 좋은 코티나라는 차였다. 그 지호네 옆에 있던 건물이 빨간 벽돌의 산울림 소극장이었다.
나에게 있어 산울림 소극장과의 인연은 친구 집에 있는 우리 동네의 이웃이었다. 우리 집은 과히 크진 않지만 나는 신촌에 사는 것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좋은 대학들이 많아 지성적인 데가 있어 보이고 극장이 많은 것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녹색극장을 비롯하여 신영극장을 개축한 아트 레옹, 영화나라 그리고 그랜드까지 많은 영화관이 있다. 대부분의 극장이 영화중심인데 그래도 그 중심에 『산울림 소극장』이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촌에 연극극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우선 이대 앞에 『시민 소극장』이 있었고 서강대학 앞에는 『예당소극장』이 있었다. 그리고 그랜드백화점으로 바뀌었지만 원래는 백화점이었던 그곳에 『크리스탈 극장』이 있어서 연극이니 콘서트 등을 공연하였었다. 한때는 들국화의 Live concert가 100회 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명했던 소극장이기도 하였다. 지금은 길 건너에 무용극장인『창무 예술원』이 있고 한때 폐쇄직전까지 갔었던 『씨어터 제로』가 있으며 순전히 아동극만 하는 『동방소극장』은 아직도 존재한다.
내가 산울림에서 연극을 보기 시작한 것은 대학 입학 후 윤석화의 모노드라마 <목소리>부터이다. 그때도 관객이 많이 들어 겨우 뒤편에 자리를 잡고 연극을 보았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전화선을 목에 칭칭 감고 절규하던 모습은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 있다. 이후로 산울림 연극과 함께 연극공부의 역사도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에는 <고도를 기다리며>를 시작으로 <셜리 발렌타인>,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 <목화밭의 고독> 그리고 <영영이별 영이별>에 이르기까지, 20주년을 기념하는 주옥같은 다섯 개의 작품들이 공연되었다. 산울림의 대표 작품인 <고도를 기다리며>와 여성연극의 레퍼토리인 <셜리 발렌타인>과 <엄마는 오십에 바다를 발견했다>는 산울림의 레퍼토리이자 페미니즘 연극의 모델이 되어 버렸다.
그중 이번에 초연한 <목화밭의 고독>과 <영영이별 영이별>은 아마도 산울림이 아니라면 올리기 힘든 그런 공연이었다. 우선 <목화밭의 고독>은 그 텍스트부터가 난해하다. 아무런 장치 없이 배우들의 대사로만 난해하게 얽혀있는 이 작품은, ‘주인과 손님’ 혹은 ‘파는 자와 사는 자’ 혹은 ‘공격자와 수비자’ 그 어느 것도 명확하지 않은 두 사내의 대사가 끝도 없는 미로처럼 관객에게 던져진다. ‘제길, 이렇게 불친절한 작가 같으니라고!’ 그러나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 작품은 언어의 유희였고 절묘한 극작술의 백미였다. 내뱉는 대사로만, 아무런 연극적인 장치 없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두 배역 사이의 탐색과 싸움에서, 관객이 작가의 성찰의 속도를 따라잡기란 애초부터 무리였다. ‘그래, 완벽한 이해는 하지 말기로 하자.’ 공연이 끝났을 때 느껴지는 그 헛헛함, 그 고독감을 품고 철길을 따라 터벅터벅, 가을의 서정을 가슴에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아마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짚고 싶은 것은, 앙상블을 이루는 연기자의 조합이 박용수와 김철리에서 박용수와 한명구의 조합으로 갔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느껴지는 그 헛헛함, 그 고독감을 품고 철길을 따라 터벅터벅, 가을의 서정을 가슴에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었다. 아마도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짚고 싶은 것은, 앙상블을 이루는 연기자의 조합이 박용수와 김철리에서 박용수와 한명구의 조합으로 갔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었다.
마지막 작품으로 올랐던 윤석화의 <영영이별 영이별>은 겨울이 올 즈음에 막이 올랐고 봄이 오면서 막을 내렸다. 유난히 초겨울 추위가 매서웠던 12월, 산울림의 작은 공간에 난방기의 소음은 최대의 적이었다. 12월 첫눈이 내리고 갑자기 기온이 급강하했던 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공연을 보았는데, 흰 적삼 하나만 걸치고 공연한 배우의 몸은 더더욱 쉽지 않았으리라! 그래도 이 공연은 꾸준히 대중에게 회자되었고 마지막까지 순항중이라 다행이다 싶다. 배우 개인도 이 작품을 끝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다고 하니 산울림 20주년의 대미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 같다.
요즈음 신촌은 대학가라기보다는 웬만한 유흥가 뺨치는 수준으로 변하고 있다. 그래도 신촌에는 산울림 소극장이 있어서 연극은 끊임없이 올라간다. 한 극단이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꾸준히 공연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유례가 없지 싶다. 산울림이 위치한 공간은 신촌과 홍대 중심의 어중간한 지점이다. 그런데도 관객들은 잘도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연극과는 달리 연령층이 높다. 특히나 모녀가 함께 나란히 오는 모습은 다른 극장에는 볼 수 없는 정겨운 풍경이다.
그래서인지 산울림 소극장이 있어서 우리 동네가 근사한 것 같다. 아니 신촌이 멋져 보인다. 그리고 한국연극의 격도 올라가 보인다. 나는 꿈꾸어본다. 신촌에도 작은 소극장들이 오순도순 생겨나서 대학로에 버금가는 그러한 문화타운이 되었으면 하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을 꿈꾸어 본다. 꿈과 착각은 자유이니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