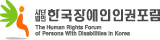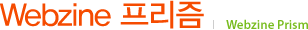- 포럼칼럼
- 또 다시 인식이 문제다
- 인권 REPORT
-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과 전망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
- 컬쳐포유
- 내 인생의 만남
- 문화 에세이
- 포토 에세이
- 사람의 향기
- 시네라리아를 찾아서
- 현안칼럼
- 헌재의 안마사에 관한 규칙
- 위헌 판결에 대하여
- 시선과 소통
- 현장 스케치
- 7회 장애인 서울대회를 주목하자
- 장애인 당사자의 공직참여, 경험과 교훈
- 포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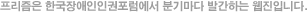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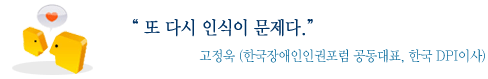
혜택을 달라고 부르짖는 사회
얼마 전 모 여류 작가가 주요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읽어보고 기가 찼다. 그녀는 자신이 글을 쓸 집필실을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떠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와 같은 작가들에게 집필실을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거였다. 나 역시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런 요구를 어디에도 해본 적이 없다. 글을 쓰는 건 철저히 자기를 위한 일이고 직업이다. 개인의 직업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달라는 격이어서 그녀의 상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공장 하는 사람도 정부에 공장 부지를 달라고 할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가게 공짜로 좀 내달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애인은 과연 부러운 혜택의 대상자인가
나는 이 경우를 우리 장애인의 문제에 대입을 시켜본다. 간혹 보면 장애인들이 받는 피상적인 혜택을 부러워하는 얼빠진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자동차의 세금이 없다든가, 유원지나 박물관 등에 무료로 들어간다든가 하는 것을 보고 장애인은 좋겠다고 하는 것이다. 심지어 나 같은 사람은 지하철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공짜라서 좋겠다니 할 말이 없다. 하긴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절묘하게 어떤 혜택의 기준에 들어온 사람들은 말한다. 자신은 생활에서 별 불편을 못 느끼면서 장애인의 혜택은 다 받는다고. 마치 무슨 벼슬이라도 한 것처럼 좋아한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한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혜택은 아무리 많아도 지나치지 않다고.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정착된 사회야말로 선진사회이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 말한다. 미국을 흔히 장애인 천국이라고들 부른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완벽에 가깝기 때문이다. 주차공간,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등. 그럼 미국은 그저 선진국이어서 그렇게 해놓은 건가? 돈이 넘쳐 나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다. 미국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장애인 동지들의 많은 저항과 투쟁이 있었다. 전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는 미국이 그렇게 장애인을 배려하고 대접하며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세계대전, 한국전쟁, 월남전, 그리고 지금은 이라크전에까지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인가? 전쟁에서 장애를 입고 돌아와도 먹고사는데 지장없게 해주기에 싸우러 나가는 것이다. 전쟁영웅이 되어 휠체어를 타고 의 수족을 부착하고 돌아와도 덜 억울한 것이다.
억울하게 비용을 많이 쓰는 존재 장애인
우선 나는 장애인은 억울하게 비용을 많이 써야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오래 전에 고속도로 할인증을 박탈당했다. 일차적인 이유는 차를 바꿨는데 과거의 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그로 인해 6개월간 재발급이 안되더니 나중에는 차의 엔진 출력이 커서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큰 차를 타는 건 이유가 있다. 휠체어를 실어야 할 뿐 아니라 다섯이나 되는 덩치 큰 가족을 데리고 다니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큰 차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할인을 해줄 수 없다는 거다. 오히려 휠체어니 리프트니 하는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그나마 있는 할인 혜택을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은 영영 작은 차만 타야 한다는 논리인가? 네덜란드의 경우의 예를 들어보면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다. 그곳에는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장애인이 있으면 그 장애인이 없어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몇 명이고 지하철을 공짜고 타고 다니며 각종 혜택을 누린단다. 어떻게 그런가 싶어 이유를 물어보니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다. 한 가족 내에 장애인이 있다는 건 그만치 가족 구성원이 국가를 대신해 그 장애인을 부양하고 보호하느라 고생을 한다는 거다. 그런 가족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였다. 그렇다. 장애인 한 사람이 움직이는 건 그 장애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그의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가 그 뒤에 있어야 장애인 한 사람이 자유롭게 이동을 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그 장애인 한 사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들이다.
비장애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다른 정의로 장애인을 규정한다면 비장애인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비장애인을 상대로 강연을 하거나 하면 내가 자주 드는 예가 대구 지하철 참사다. 웬 사람이 불을 지르는 바람에 수많은 희생자가 난 그 사건을 누구나 기억하고 있다. 사고 당사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사건 이후 우리가 이용하는 지하철은 더욱 안전해졌다. 사람들의 경각심도 한층 강화되었다. 그 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뻔했지만 모두 용감한 시민들의 사전 신고나 검거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안전해진 지하철을 타고 다니게 되었다. 결국 그 희생자들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아야 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언뜻 보면 이 사회의 짐이고 부담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식을 바꿔보면 그들은 이 사회 구성원들이 겪을 미래의 고통을 미리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장애인이라 해도 늙어서 관절염으로 걷지 못하게 되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 그때 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나 경사로를 보면 반드시 그걸 만들도록 오래 전에 싸우고 투쟁한 선배 장애인들을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의 고통까지 나눠지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장애인들에게 더더욱 많은 혜택과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 차별 금지는 법으로 정해져야 하고 연금을 지급해 그들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사회의 인식이 그렇게 바뀌어야만 장애인이 더 이상 장애인임을 느끼지 못하는 세상이 온다.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의 안전망이고 누구나 가야 할 장애인의 길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문제는 다시금 인식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