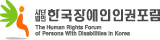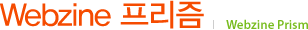- 포럼칼럼
- 여성주의적 리더십
- 인권 REPORT
- 장애인 판정제도의 개편에 대한 소고
- 장애인지적 예산관점에 따른 일반예산 분석과 장애인지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
- 윤삼호의 장애학
- 미국실용주의와 장애학
- 페미니즘과 장애학
- 컬쳐포유
- 역사속 장애인
- 최강문의 영화이야기
- 시네라리아를 찾아서
- 맛집 이야기
- 손으로 그리는 세상
- 시선과 소통
- 노숙, 정신장애 혹은 인권의 비전
- 변화를 읽는 네가지 방법
- 하성준의 유학일기
- 포럼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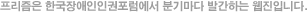



사람들이 슬픈 영화를 찾는 이유는 하나다.
울고 싶어서.
극장을 들어서고 나서면서 무슨 토를 달든 간에 슬픈 영화를 보는 까닭은 하나다.
울고 싶은 거다.
그렇다,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까닭이야 어쨌든, 그저 펑펑 울고 싶을 때가 있다. 고전적으로 말하자면, 울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 속에서 자신의 심성을 새롭게 정화하는, 그래서 한바탕 울고 나서 속이 후련해지기를 기대하는 거다.
영화의 입장에서는, 찬스다. 옆 좌석에 앉은 사람이 아는 관계이든, 모르는 관계이든, 그저 관객들이 펑펑 눈물 쏟아버린 뒤, 충혈 된 눈, 퉁퉁 부은 얼굴로 극장 문을 나서게 만들면, 그러다 아이스커피 한 잔, 아이스크림 하나 손에 쥐고서 씨익~ 미소 지을 수 있다면 정말이지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입소문이 번질 것이고, 극장 스크린을 다른 영화에 빼앗기지도 않은 채 승승장구, 나아가 예매 율 상위 10위권에 들고, 그 기세를 몰아서 흥행 1위의 자리까지 넘보게 된다면야, 그야말로 자신을 탄생시킨 감독 선생님께도 보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아, 영화의 입장이야 어찌 되었던 간에, 각설하고.
감정이 메마르지 않았다고 자부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남들처럼 풍부한 감정을 갖고 있지도 못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성격의 소유자인 나로서는 슬픈 영화에 대한 기억을 별로 갖고 있지 못하다. 영화를 보면서 울었던 기억이… 별로 없다.
얼마 전, 그러니까 두어 달쯤 전, ‘슬픔’을 아예 드러내 놓은 한국영화가 있었다. 카피부터 남달랐다.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제목도 카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 줄거리도 그러했을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아니면 사고로 부모를 여읜 남과 여. 둘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한 집에 동거하며 가족처럼, 친구처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런데 남, 누가 멜로영화 아니라 할까봐, 당연히 백혈병이다. 물론 여에게는 비밀. 남은 여 사랑하기에 여 잘 나가는 치과의사에게 보내준다. 뭐, 결말은 더욱더 뻔하지 않나?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라는 시집으로 유명세를 탄 작가의 영화 데뷔작. ‘사랑언어의 연금술사’라는 찬사를 받는 그가 대본을 마련하고, 마이크까지 잡았다. 그런 까닭에 희한한 대사들도 적잖이 나왔다. 예를 들자면, ‘사랑은 양치질 같은 거야 … 남에게 보이려고 양치질 하냐?’ 따위. 한류스타 권상우를 비롯해, 배역들도 꽤나 무게감 있다. 게다가 본전은 건졌다고 하니, 어느새 척박해진 한국영화 시장에서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이다. 그것도 신인감독의 데뷔작으로서는 더더욱!

어쨌거나, 사실 나는 멜로영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니,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같은 영화도 보지 않았다. 그렇다고 영화를 보면서 운 적이 없냐 하면 그건 아니다. 나에게도 슬픈 영화가 있다. 물론 많지는 않다. 기억을 곰곰이 씹어보면 두어 번 정도?
첫 번째가 이십여 년 전 <잡초>다. 닉 놀테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 1987년작. 미국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영화다. 이 영화를 개봉 2년 뒤인 1989년 부산의 조그마한 극장에서 봤다. 종신형을 선고받은 주인공 닉 놀테는 교도소에서 위문 공연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보며 새로운 삶, 인간의 삶을 꿈꾸게 되고, 어찌어찌 가석방, 그리곤 감방 동기들과 힘을 모아 연극을 준비하게 되고, 브로드웨이 무대에까지 서게 된다. 급기야 교화 차원인지는 몰라도 교도소 위문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만 교도소 폭동의 계기가 되어 좌절하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때 나는 보았다. 교도관들의 곤봉, 최루탄, 샌드백처럼 맞다 통나무처럼 쓰러지는 죄수들…. 그 장면들 사이사이로 그다지 오래되지도 않았던 기억들이 한 장면 한 장면 끼어들어갔다. 교차하는 장면들이 더 큰 감정의 반향을 만들어낸 탓일까?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전함 포템킨>의 ‘오뎃사의 계단’처럼 말이다.

두 번째 기억은 불과 2년 전, <화려한 휴가>에서였다. “저희들을 기억해주십시오.” 간호사로 분장한 이요원이 외쳤다. “광주시민 여러분, 저희들을 기억해주십시오!” 그래, 어떻게 잊을 수 있으랴…. 또 다시 영화장면은 내 기억과 오버랩 되었고, 그저 펑펑 울고 싶었다. 마흔 중반, 어디 ‘채신 머리 없다’ 들을까봐 슬그머니 눈 밑을 훔쳐내긴 했지만, 정말이지 펑펑 울고 싶었다. 영화 이상으로 슬펐다.
울고 싶었다. 아니, 울지 않으려 했다.
슬픈 영화를 보지도 않았건만, 중년의 채신을 내팽개치지도 않았건만, 울고 말았다.
그렇게 되고 말았다. 달리 어쩔 수도 없었다.
입술 굳게 깨물고 다짐했건만, 그저 하염없이 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무리 펑펑 울어도 후련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가슴 속 서슬 푸른 칼만 더욱 벼리게 되는…. 2009년 5월의 대한민국, 슬픈 영화보다 더욱 슬픈 현실의 모습에, 그저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슬펐다.

(출처 http://niceturtle1.tistory.com/650)